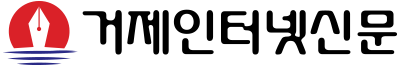거제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관장…바라만 보던 “하얀 등대”를 넘어 어디론지 떠나고 싶다.

장승포 “하얀 등대”의 바닷바람은 은빛 찬란한 수정들을 머금은 체 손짓하여 부른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외출복에 잘도 어울리던 목걸이처럼...
지금쯤 거제면의 제법 넓은 평야에는 고개 숙인 벼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학동” 가는 길목에는 사철 붉은 단풍들이 가을 행락객을 맞을 것이다.
이 가을 고개 숙인 벼들이 내는 빛깔은 자연의 빛으로 더없이 숭고하며, 화가들이 화폭에 담아내는 완성의 작품처럼 다가온다.
찬란하되 번쩍이지도 않고, 황홀하되 자극하지도 않으며, 눈부시되 찬란하지도 않다.
참으로 소박하고 아름답게 추석 전야를 물들이는 빛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들의 모습은 겸허하고 거룩하다.
“산방산 비원” 가는 길의 언덕배기 밭두렁에는 호박꽃의 황금빛깔이 정겹다.
내가 자란 고향 길과 사뭇 다르지도 않다.
“황포”에는 어부의 손길이 닿은 낡은 배들이 이시대의 역사처럼 줄지어 정박해 있다.
아버지의 인생이다.
바다의 마음, 하늘의 정성으로 이번 여름 세 번의 큰 파도를 만났다.
바람과 비가 만나서 빚어낸 상처의 빛깔을 들판이 감당하는 것은 아닐까?
격동의 하늘이 바다와 함께 보여주던 태풍은, 인간의 작고 초라함을 새삼 확인해주는 은총의 공연이리라.
하늘이 내려다보는 바다는 이제 가슴을 열면서 손짓하고 있다.
홀로 길을 나서고 싶다.
이름 모를 작은 마을 농가의 가족에게 풍요를 주는, 가을 들판에 서서 벼들처럼 나도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누구는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단지 고개를 들면 먼저 잘려나가기 때문이다“라고 한 괴변이 생각난다.
이제 곧 추수가 끝나면 들판도 말끔히 비워진다.
찬란하던 황금빛도 사라지고 흙으로 녹아 퇴비의 색이 된다.
내 인생은 어떤 색일까?
노력도 시련도 없이 보호색을 칠하며 화려한 색깔을 탐하여 온 것은 아닐까.
계절의 여왕이 봄이라면 가을은 계절의 황제이다.
고개 숙인 벼들의 가운데에는 어김없이 허수아비가 서 있다.
생명력도 없이 바람을 타고 헛 모습만 뽐내고 있는 나는 허수아비는 아닐까
바다를 찬란하게 하는 태양빛은 무채색이지만 눈이 부시다.
홍포와 여차의 노을도 365일 붉지만은 않다.
구름에 가린 날들도 있으며 폭풍전야를 만나기도 한다.

가을의 한복판에 이르는 시월에는
저기 하얀 등대 앞으로 펼쳐진 바다로 나가면 있을 “외도”나 “장사도”라도 만나보고 싶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도 이번 추석에는 한 이틀 고향에 한번 다녀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