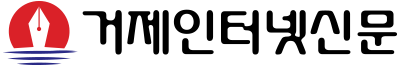김범용 자유기고가…다른 책, 홍세화의 [생각의 좌표]

광주 민중 항쟁은 진실조차 알 수 없는 데, 도서관에 처박혀 공부한다는 것은 사치이고, 나는 왜 대학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황지우는 새들도 세상을 뜬다하고, 김수영은 박정희의 무덤이 아니라 시(詩)에 침을 뱉으라 했다.
그 시절 매일 나는 주막의 막걸리에 취해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란 운동권 가요 같은 것들을 부르다 잠이 들었다. 이제 486세대가 된 그 시절 친구들은 80년대 군사독재 시대의 트라우마를 낙인처럼 가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다.
군에 다녀와서 마르크스로 부터의 탈출은 어렵지 않았다. 단조로운 붉은 책들과 결별하는 일도 어렵지 않았다 .칼포퍼도, 막스베스도, 케인즈도 다양한 생각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와 진실에서 탈출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았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는 미안하지만 뒷전이었다. 내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두 발로 버텨 서 살아가야할 이 세상에서 내 존재의 이유와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
기득권에서 정의와 진실을 찾기는 어려웠다. 종교에라도 심취하고 싶었다. 짧지 않았던 시대와의 불화 속에 살아가는 일이 불편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리고 결국 인간적인 나약함을 변명삼아 끝내 나는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차라리 나는 편이 없는 고독한 리버럴리스트가 나았다. 그렇게 좀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내 생각을 편하게 만들었다.
‘똘레랑스'라는 불어 단어를 알게 된 건 홍세화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를 읽고 나서였다. 이사람 참 노무현이나 전태일이 만큼 불편했다. 그 사람이 또 책을 내었다고 해서 찾아보았다. 인터넷을 알고부터 책방에 가본지 오래다. 책 살 돈도 넉넉하지 않고 해서 습관적으로 서핑해서 서평을 찾아 읽는다. “생각의 좌표”라는 책이다. 홍세화를 아는 만큼 읽게 되면 우리를 괴롭힐 책임은 분명하다.
사람은 누구나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생각한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전산용어처럼 비슷하게 쓰레기만 들어가면 쓰레기만 나오는 것이 사람의 두뇌작용이기도 하다. 사람은 알고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믿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란 거다.
정보가 차단되고, 믿고 싶은 선택적인 정보만 습득하면 사람은 옹고집이 된다. 배운 사람일수록 나이 먹게 되면 자기에게 편하거나, 이익이 되는 정보나 말만 듣고 싶어지고, 남의 바른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것도 사회의 보수화와 관계가 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프랑스의 똘레랑스 정신을 표현할 때마다 인용되는 철학자 볼테르의 말이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다름에 대한 인정(불일치에 대한 동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똘레랑스는 가장 중요한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정신이다. 인간은 누구나 서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여러분도 홍세화와 다르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그의 글을 읽어 보고 난 이후에 판단하기를 권한다. 다음은 서평과 그 책의 일부이다. 이 시대의 젊은 영혼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영혼이 없는 인간은 살아있는 시체, 좀비(Zombie)라고 한다.
거제에 돌아와 받은 문화충격 중 하나가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누구 누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었다. 아이들의 과도한 욕 사용문제가 교육현장의 문제만 아니라, 어른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인간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앙드레 말로의 책 제목 같은 '인간의 조건'이 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아 제발 책 좀 읽자. 부디 매일 PC방에서 세월 보내지 말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알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진정한 인간이 되자. 비록 우리 거제에선 서로 다 사람 아니다 라고 하니 ‘좀비’같은 어른들이 너무 많을지라도.
“거짓과 위선 속에서 편하게 살아갈 때, 진실이란 항상 불편한 것이다. 길에서 노숙자와 거지를 보는 것 또한 불편하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고 보고 싶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에서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되묻는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그 외의 다른 의견은 불온한 생각이라고 밀어붙이는 정부와 대중매체에 동조하는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질문한다.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그런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 왔나요?'라고 말이다.”
“내 생각의 주인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지만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에서 사람을 보기 위한 방편이다. 용산 참사에서 우린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 것이 진실이고, 그에 대한 생각은 과연 내 생각이 맞는 건가? 약자인 내가 약자의 편보다는 강자의 논리에 휩쓸려 떠다니는 건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은 편함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특히 정의와 진실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요구한다. - 144p.”
“서민 대중의 무지와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유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정치가 혐오스러우니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에는 '백로야, 까마귀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는 식으로, 혐오스러움에 물들지도 않겠다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정치 혐오는 실상 혐오스런 정치를 계속 혐오스런 상태로 있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힘이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혐오스러운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누가 바꿀까.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남이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정치 혐오나 탈정치는 간단명료한 명제조차 인식하지 못할 만큼 주체적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182p.”
“그들에게서 인간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말할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인간을 사랑하는 한, 인간의 삶을 사랑하는 한, 인간다움과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 205p.”